경, 또다시 가을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무에게도 길을 묻지 않는다. 너 없는 긴 시간 나 너무 허기졌구나. 마른 침을 삼킨다. 즐겁게 나부끼던 우리의 속삭임은 메아리로도 남아있지 않다.
경, 그곳은 얼마나 좋으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렸다 정답게 손잡고 갈 것이지, 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그렇게 총총, 밤하늘을 가로질러 갔느뇨.
경, 네 몸에 들어와 일순간 뿌리내린 지독한 병에게 묻고 싶다. 왜 가을이었는지, 왜 하필 짧디짧은 가을이었는지. 긴긴 겨울이었다면, 내 너를 보듬어 서해바다를 볼 수도 있었으련만. 네가 나를 살게 했듯 나 또한 너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을. 너 때문에, 이제 나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져 버렸다.
경, 기억하니. 처음 짝이 되었을 때, 넌 나를 참 많이 귀찮아했었지.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를 쫓던 차진 너의 눈빛. 슬쩍 건네던 가나초콜릿 한 조각. 긁힌 팔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던 너의 따스한 입김. 축 쳐진 나를 부축해서 힘겹게 오르던 담장 높은 길. 5월의 넝쿨 장미가 눈부셨던 빨간 대문집. 바람이 바람을 불러 바람 불게 한 87년 11월 11일의 나무벤치. 우리 반에서 가장 작았던 너와 나의 여린 손. 창백한 낯빛을 도드라지게 한 까만색 뿔테 안경. 한 짝씩 나눠 끼던 빨간색 벙어리장갑. 랜드로바 납작 구두. 분홍색 존슨즈 베이비로션의 엷은 향기. 나달나달해진 전혜린 그리고 자크와 다니엘의 회색노트. 마이마이 카세트로 듣던 메리 홉킨의 노래들과 파블로 카잘스가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청소시간 5층 창문에서 내려다본 교장선생님의 쓸쓸한 뒷모습. 광안리 밤바다의 축축한 모래와 훅 끼치던 짠 내음. 비 오는 날 유엔묘지의 푸른 수액을 내뿜던 나무들. 다대포의 선연한 핏빛 노을과 실뱀 같은 연흔. 가을날 강물의 유장한 흐름. 보수동 책방 골목의 주황색 램프가 켜지는 시간. 찬 겨울 따끈따근한 붕어빵과 한 여름 녹아내리던 부라보콘. 죽을 만큼 아팠던 시간을 함께했던 이문세 4집 앨범. 2층 뒷자리에서 봐서 안타깝기 그지없었던 아아 스무 살의 첫 뮤지컬 에비타. 황동규 시월과 헤세의 유리알 유희.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와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 불꽃의 여자 시몬느 베이유와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삼십세. 하루 한 수씩 아껴 읽던 백석시전집을.
경, 너를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구나. 한동안 나는 너의 부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너의 죽음과 맞물렸던 그때는 내가 유일하게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이었으니. 나는 너의 죽음도 모른 채 어딘가를 무수히 헤매다녔다. 오늘을 걸어와 흙 묻은 흰색 운동화 끝으로 툭툭 쳐보는 땅은 비로소 나를 일어서게 했다. 하지만 세기말, 결국 너는 겨울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 자꾸 정체된다. 서늘하게 깨어 생각만 골똘하다. 여전히 나는 방향을 잃고, 입에서는 단내가 난다. 아직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 경. 슬픈 몸에서 영원히 끊지 못할 아픈 탯줄 나의 경.
========================================
박승화 씨,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경과 제가 함께 들었던 이문세의 <소녀> 들여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연 보면서 마음 좀 추스리고 싶어서 조영남 가곡의 밤 신청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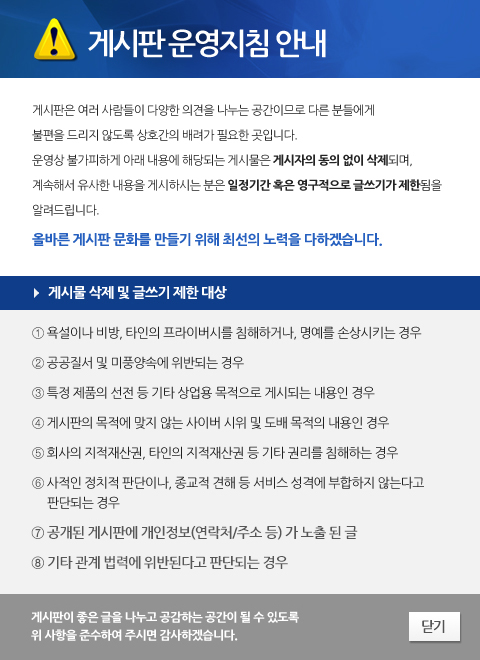
<조영남 가곡의 밤> 가을에 떠난 경을 그리며...
박혜정
2013.10.11
조회 63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