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에 아들이 대학에 갔다. 아들은 내가 가난뱅이인 까닭에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은 제가 벌어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며 우리 부부를 안심시켰다.
그러더니 각종의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스스로’ 다녔다. 3년 뒤 딸도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딸은 서울의 대학인지라 상경하게 되는 바람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무리 국립대학이고 또한 장학금을 항상 받았다지만 용돈 내지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송금해주지 않는다는 건 아빠로서 분명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딸이 대학의 졸업을 앞둔 즈음 ‘이제 내 고생도 끝났다!’ 싶어 내심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딸은 ‘배신의 칼(?)’을 빼들었다. 내처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한 때문이다. 따라서 1년의 휴학을 빼고 7년 동안 매달 박봉을 쪼개 딸의 바라지를 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젠 괜찮다.
아들에 이어 딸 역시 안정적인 직장의 직장인이 된 때문이다. “50년쯤 지나면(...) 공공도서관에서 연체료 50달러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교육에(...) 15만 달러를 퍼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1997년에 방영된 미국 드라마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의 대사는 오늘날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과연 34년 후엔 그처럼 그야말로 ‘껌 값’만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은 대학을 빚 없이 졸업할 수 있을까?
대학의 등록금은 여전히 오름세고 개인별 소득은 둔화되고 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고, 이는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다녀라’는 식의 정책은 부모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건 비단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미국의 전 교육부장관이었던 윌리엄 J. 베넷의 미국인 정서와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확연한 당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주변에서 힘들게, 그리고 거액의 빚을 들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취업이 안 되어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쉬 볼 수 있다.
과거엔 대학 아니라 고졸 학력만으로도 소위 펜대를 굴리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지금은 언감생심이다. 이른바 명문대 내지 특별한 재주가 없는 이상 대학을 나오지 않고선 입에 풀칠하기에도 급급한 게 저간(這間)의 현실인 때문이다.
<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 당신에게 대학의 가치는 얼마만큼 있는가?> (데이비드 와일졸 공저 / 이순영 올김 / 문예출판사 출간)는 결론적으로 ‘돈 먹는 하마’에 다름 아닌 대학을 가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하여 진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쓴소리의 보기 드문 동병상련 수작(秀作)이다.
대한민국에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불문율의 성역까지를 과감히 건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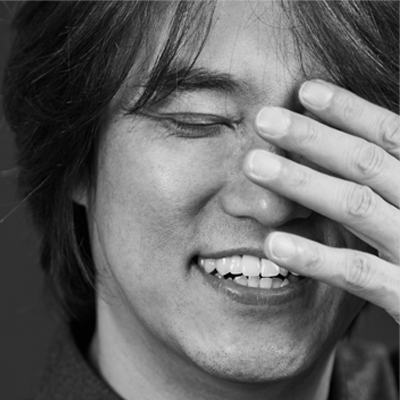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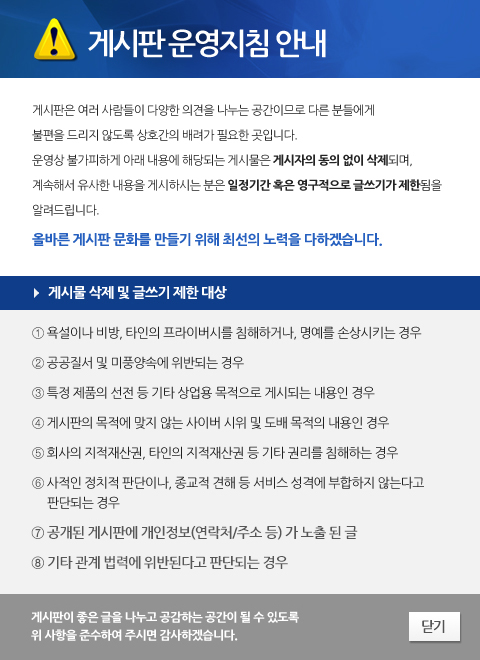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