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목련이 지등처럼 하나 둘 필 때쯤이면 왜 이리 맘이 설레 이면서도 아련한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신부의 고운 드레스처럼 수줍은 얼굴로 하나 둘 피었다가, 어느새 아프게 지는 꽃들을 보며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고 축제 때, 그때도 지금처럼 봄꽃들이 여기저기 반짝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축제의 열기가 고조되었을 무렵, 옆반 친구가 통기타로 노래 부르는 걸 본 후 넋이 나갔던 것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잘 연주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단 지 그 애의 기타를 튕기던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던 것 일겁니다. 내리 오빠들의 대학진학으로 딸이었던 저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운 나쁘게도(?) 셋째로 태어나 원하는 인문계에도 못가고 대학은 꿈도 못 꿀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와 한없이 방황했던 여고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생활이 별로 재미도 없고 해서 남들보다 먼저 졸업하기 전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도시에서 적을 두기란 쉽지 않았고, 문득 첫 월급을 타서는 여고시절 옆반 아이가 쳤던, 그렇게 멋져보였던 통기타를 사러 시내에 갔습니다. 기타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단지 그냥 멋져보여서 사들고 와서는 참 난감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혼자 꺼내 띵가띵가 할 수도 없었고, 누구 하나 알려줄 사람도 그 당시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으니까요.
생각 끝에 시내에 있는 통기타 학원에 떡하니 등록을 하고 일주일 한 두 번 학원엘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자애는 타고났는지 셔플도 잘하고, 슬로우 락도 잘하고, 하여간 주눅이 들기도 하고 손끝은 왜그리 아프던지요...그 당시 저는 뭔가 시작하면 이를 갈고 끝장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해보고 안되면 일찍 포기하는(?) 내길이 아닌것이다고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자의반 타의반 폼만 멋지게, 기타를 어깨에 떡하니 메고 다니면서 있어 보이는 거에 만족해하면서 이십대를 보냈습니다.
십 수 년이 지난 요즘, 이렇게 봄이 오고 그때처럼 목련이 여기저기 그림처럼피는 걸 보면서 그때 그렇게 멋지게 치고 싶었던 통기타와 함께 “양희은-하얀목련”이 흥얼거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끝장은 아니더라도, 이십대에도 없던 열정기가 아줌마가 되어 생겨서 그런지, 한번쯤은 포기하지않고 다시 기타를 잡아보고 싶어지는 봄입니다. 대책도 없이 또 통기타를 사서 장롱속에 숨길까봐 살짝 두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이 가기전에 십수년만에 또 용기내어 볼까요 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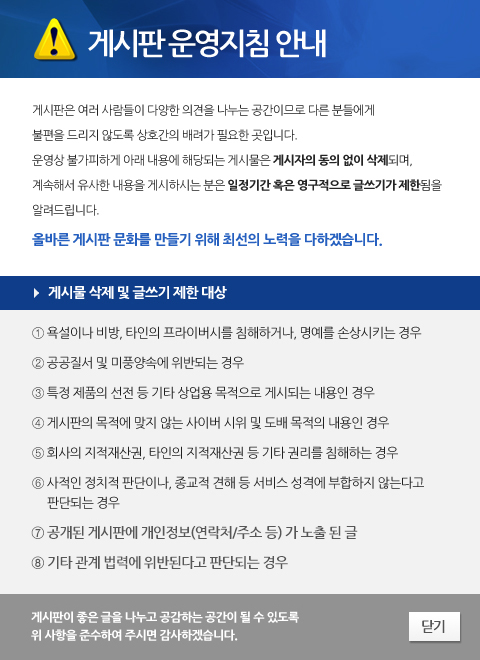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