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장 너머에서 고개 내민 노오란 개나리가 예뻐
‘아~ 참 좋다. 봄이 이렇게 좋은 걸 ’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내 뒤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 ’
무심히 던지는 딸의 말에
같은 봄이 아니지, 내년에는 또 다른 색깔의 봄 일테고 지금의 봄은 다시 오지 않는데‘ 생각하며 말없이 웃습니다.
그래요. 이제 40후반이 넘어서 50이 되는 중년의 나이가 되니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게 어릴적 봄은 겨우내내 웅크리고 있다 살짝 고개를 내민 봄나물을 캐러 동네 작은 계집아이들끼리 삼삼오오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과 들로 다니다 해질 저녁 무렵이 되어서
냉이, 씀바귀,,, 돌나물, 때로는 먹지 못하는 풀들을 바구니 가득 캐서 돌아오기가 일쑤였지요.
돌아오지 않는 딸을 찾아 헤매던 엄마의 애타는 모습과 안도의 댓가인 회초리를 간혹 맞기도 했지요.
돌이켜 보면 봄나물과 엄마는 나의 봄 기억입니다.
봄은 엄마 같습니다.
봄에 향기롭게 올라온 여린 쑥을 캐서 쑥개떡을 해주시던 엄마
쫄깃한 쑥향이 가득한 그 볼품 없었던 쑥개떡의 봄 향기가 그렇게 그릴수가 없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겨울을 이기고 돋아난 봄의 싹들이 정겹고 그래서 더욱더
엄마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바구니들고 재잘대며 봄이 가득한 들판을 누비던 그 소녀들은 지금쯤 또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있겠지요.
지금은 제 곁에서 ‘ 뭐가 그리 좋아. 같은 봄인데...... 하던 딸은 없지만요.
그래서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줄 봄 노래가 있습니다.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이문세의 봄바람
부탁드립니다. 꼭 들려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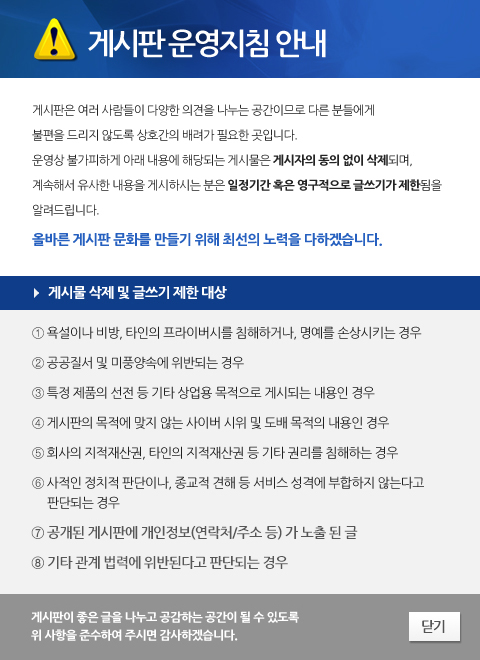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