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틈새로 흐드러진 황국을 볼 때 쯤 이면, 밤을 헝클어 놓는 아이가 생각난다. 그 아이는 눈매가 탁 트인 벌판처럼 시원했고, 눈썹은 꿈을 꾸는 강아지풀 같았다. 키는 보통아이를 훌쩍 넘는 큰 아이였다. 그에 비해 나는 왜소하고 겁이 많은 소심한 편이었다. 그때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어 한 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갈 때에는 사이좋게 가다가도 올 때에는 찌그락 거리다 혼자 오기가 일쑤였다. 왜 싸우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 아이는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질러 간다. 조금 후, 심술궂은 남자애들이 겁먹은 나를 막고 선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 보았는지 냅다 가방을 던진다. 맞은 남자애가 휘청하면 긴 다리가 그 애를 향해 날려 보낸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는 나를 앞질러 그 아이는 삐진 척 또 간다.
그러던 어느 겨울, 눈이 참 많이도 온 날이었다. 논바닥에 세워놓은 볕 짚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뛰어 내려갔다. 그날도 토라져 말 한마디 안한 상태였다. 눈을 뭉쳐 고깔 모양의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볏짚 모양을 따라 하다 보니 예쁜 집이 되었다. 에스키모인 들의 집처럼 환상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안에 작은 엉덩이를 밀어 넣었다. 바람도 막아주고 아늑했다. 그러다 집 쪽을 바라보니 산들의 입술만 까맣게 보인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속으로 돌무더기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옆 하늘을 보니 해님은 개천을 넘어 힐끔 거리고 있다. 종종 걸음으로 뛰기 시작한다. 얼마가지 못해 길이 안보여 갈 수가 없었다. 한참 앞질러 가던 그 아이는 내게로 와 손을 잡는다. 서로 삐져서 말도 안하는데 그렇게 해주었다. 그 아이는 내가 밤에 못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얄미울 때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울 때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약점을 퍼트려 기를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4학년이 끝나갈 무렵, 그 아이가 이사를 갔다. 나는 앞이 막힌 상자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한동안 그리워 울다가 나의 삶에 묻혀 잊고 살았다. 눈이 더 나빠져 여러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 아이가 보고 싶어진다. 어린애답지 않은 그 아이의 행동이 아무나 할 수 없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마음이 급해진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아이를 찾아 고맙다는 인사를 꼭하고 싶었다. 그날부터 열심히 찾았다. 드디어 그 아이의 친척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 손이 떨린다. 숨이 가빠진다. 버튼을 누르고 뛰는 가슴을 잡고 있는데 발효된 시간의 향기가 밴 중년이 나온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얘기하다보니 매일만난 친구처럼 곧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 친구는 민망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묻는다.
“누운은..?”
“응. 안보여. 그래도 잘 살고 있어.”
“그래. 그렇겠지.”
한다.
“내가 밤눈 어두운 것 어떻게 알았어?”
“응. 그건 네가 놀다가도 해가 저물 때면 하늘을 자주 보더라.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몰랐는데 너희 엄마가 우리엄마한테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그랬구나. 너도 어린데 내가 얄밉고 미울 때는 안 도와주고 싶지 않았니?”
“아냐.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야.”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겁 많고 소심했던 아이에게 강한 펀치로 박힌다. 살며시 잡아주던 손등위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없이 걷던 계집애들은 노란 꽃잎 속에서 별을 본다.
버들피리의 눈이 큰 아이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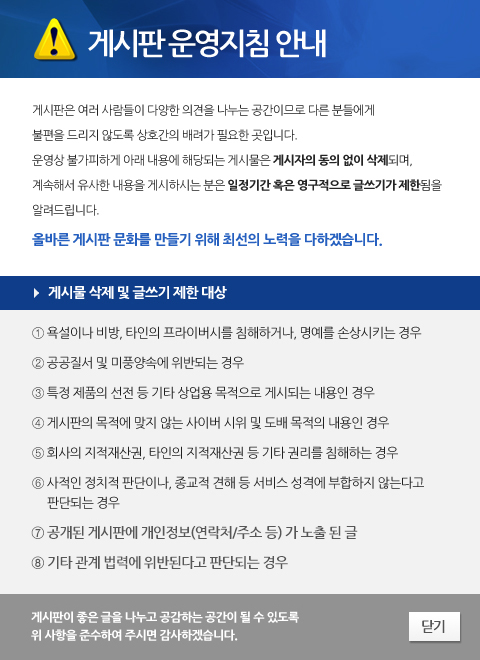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