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저녁에 남편과 집 근처 학교 운동장으로 운동을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했고, 오래간만에 밟는 흙의 서걱거림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직장에서 동료와 속상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덜어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스마트폰으로 자꾸 카톡 문자가 오는 거에요.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대꾸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하면서 건성으로 남편에게 '응, 응'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두어 번 정도 참던 남편이 결국은
"그놈의 스마트폰 쫌!"
하고 버럭 소리를 질러요.
그제서야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총총총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남편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자꾸 별거 아닌 카톡 수다에 산만하게 행동한 게 너무 미안해서 팔짱을 끼었어요.
남편은 싫어서 팔을 빼려다가 제가 꽉 잡으니 못 이기는 척 가만히 있더라고요.
"미안해. 별 말도 아닌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
남편은 그 이후로 침묵을 했고, 저는 남편과의 소중한 대화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을 아예 들고 나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산책을 가면서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챙기게 돼요.
시장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꼭 눈앞에 스마트폰을 둡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급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딱히 답을 못 찾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을까요?
집전화조차 없던 시절에도 잘 살았는데 말이죠.
오늘 남편에게 집중하지 못한 시간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리라 다짐합니다.
최성수의 '해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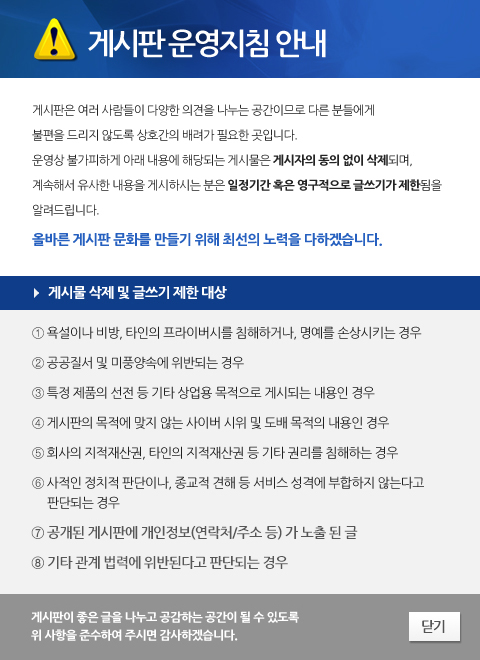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