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성격 및 운영과 무관한 내용, 비방성 욕설이 포함된 경우 및
기명 사연을 도용한 경우 , 관리자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하단,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입력란]에
이름, 연락처, 주소 게재해주세요.
*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은 많은 청취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사적인 대화창 형식의 게시글을 지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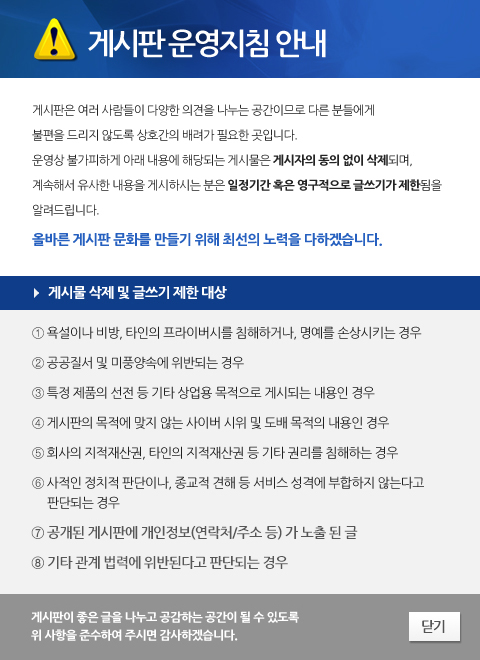
인간에 대한 이해와 오해
정주영
2011.06.06
조회 52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을 공유하고 아픔을 이야기하며 함께 울고 웃다 보면,
치유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진정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저인데....
얼마 전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숨긴 채 밝은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자신과 어울릴 거라 말하지만
아뇨. 전 그랬기 때문에 그가 더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깊은 밤에도 잠 못 드는 그가..
내막을 다 파고들 순 없지만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자 술로 나날을 보내는 그를..
세상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불신하는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도 많다는 걸.
비록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잠 못 드는 새벽시간을 공유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편이 되고자 쓴 술잔을 부딪쳤으며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려,
그의 주변을 맴돌곤 했습니다.
우연일지 몰라도 언제부턴가 그의 한숨 쉬는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또, 혹시나 내게 호감이 생긴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운을 띄운 그.
기뻤습니다.
호감을 표현해서요? 아니요.. 그가 나로 인해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실이..
그런데 착각이었을까요?
아님 그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저의 오만이었을까요?
그와 전 지금 이해는커녕 오해와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윤희씨.
나이가 든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숱한 과정의 경험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조급증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험을 종종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나이 들어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고,
어렵사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하더라도
각자 다른 삶의 경험과 믿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기 더 쉽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상실감 혹은 배신감,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포기가 더 빠르다는 거....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로 인해 변화하고 나와 함께 웃는 그를
아픔과 자책과 트라우마 밖으로 손잡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말이죠.
그가 장난처럼 감정을 표현한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 역시 그를 통해 위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이를 잊고 겸연쩍지만 조심스레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성급했던 걸까요?
그동안 자신을 봐온 모습은, 짐작과 오해일 뿐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그의 발언에
그만, 이해 받을 준비는 되었느냐며 모질게 퍼부었습니다.
호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실망감보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과 감정, 또 내 진심이 한순간에 부정 당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고 변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세상 일 그런 거 어제 오늘 안 것도 아닌데 뭐.’
의도는 이해와 소통과 치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 역시 이해 못하고 같은 말을 하고 떠나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이라도 믿었기에 배신감이 더 클까요...?
의도와 결과가 똑같을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아프게 다가옵니다.
윤희씨.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쓸어 담을 수 없겠죠?
그와 다시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져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차피 세상은 다 그래.’라는 불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나도 증명 받고 싶었고요.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은 사람 때문에 산다는 걸,
사람으로 인한 상처,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답도 없는 해묵 질문으로
그와 난 이해와 오해, 소통과 치유, 친구와 진정한 역할에 대해
오래토록 편치 않은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에 덜컥, 사람이란 참 어려운거구나...
겁 없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로하려 했던 저는,
서른 셋 나이에 새삼스레 자존감이 위태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왜 세상은 갈수록 어려운 것일까요?
소통의 창은 많아졌다고는 하나 왜 갈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된 걸까요?
배움과 많은 직, 간접 경험으로 더 여유롭고 의연해질 거라는 저의 믿음이
자꾸만 낯설어집니다.
여기까지 와서 ‘세상은 다 그래..’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한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와 나눴던 음식, 발을 맞췄던 봄 길, 화사했던 바람결만이
일장춘몽처럼 길 끝에서 '안녕'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니 괜찮아질까요?
신청곡 윤종신의 <치과에서> 부탁드립니다.


댓글
()